바로 오랜 공성전 끝에 도시가 함락되었을 때다.
고대부터 근세,근대초기까지 공성전에서 도시가 함락되면 공격군은 거의 항상 지휘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약탈과 학살, 강1간을 일삼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휘관들은 병사들이 수많은 강1간과 약탈 끝에 현타가 올때까지 손가락 빨고 앉아있어야했다.
왜냐? 공성전은 그 특성상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포위망을 형성하고 죽치고 앉아있어야 했으며,
공성군의 경우 외부의 구원시도와 포위망 내부의 돌파시도에 항상 긴장해야 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다른 야전전투들이 하루의 정해진 결전의 날에 결판이 나는 것과 대조적으로,
(물론 항상 그런건 아니지만 야전에서의 대규모 전투는 통신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거의 정해진 절차와 의례가 있는 것처럼 진행되고는 했다)
공성측 병사들은 적군 뿐만 아니라 질병과 식량부족에도 항상 시달렸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적의가 팍팍 쌓이는 유형의 전투였다.
거기다가 현대전에서도 시가지의 복잡한 지휘는 쉽지않고,
대부분의 지휘체계가 청력(나팔, 북, 트럼펫) 아니면 깃발과 같은 원시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전근대에는 더더욱 그랬다.
도심지에서 그나마 작동하는 체계는 전령 정도인데 누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명령이 전달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시가지에 공성군이 물밀듯이 밀려들면 거의 모든 경우에 지휘체계를 상실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닥치는대로 죽이고 태우고 약탈하고 강1간한 다음 남은 생존자들은 노예로 팔아먹는 것이 당연지사였다.
또한 산업화된 상비군과 관료제가 정착되기 전까지 "약탈"은 군인들이 받아야될 정당한 대가로 간주되거나 묵인되고는 했다.
소수의 상비직업군인들을 제외하면 일반 사병들은 사실상 제대로 된 급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로마제국처럼 잘 짜인 급여체계가 있어도 약탈은 엄연히 병사들에게 있어서 정당한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일선의 지휘관들이 아무리 명장이라도 돈도 제대로 못받고 구르는 군인들을 통제하려면 당근이 필요한데,
전근대의 미약한 관료제로 비싸디 비싼 공성전 끝에 도시에 대한 약탈을 막을 정도의 군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사실 전근대 시기에 함락된 도시의 약탈은 현대인이 흔히 상상하듯이 탈법적인 전범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외교협상에서까지 당당하게 요구할수 있는 승자의 고유한 권리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안사의 난 당시에 당나라 조정을 구원하기 위해 개입한 위그루군이 오히려 '허가를 받고' 당 조정의 통제하에 있는 도시를 약탈했으며,
서양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라 로마시대에는 병사와 장교들이 나서서 장군들에게 약탈할 권리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일이 흔했다.
약탈하지 않으면 함락당한 도시는 거덜날 정도의 재물을 모아서 바치는게 인지상정이였으며,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삥뜯기지만 전근대에는 오히려 자비로운 일이였다.
그래서 도시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때 지휘관들부터 나서서 도시에 대한 약탈을 약속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고는 했으며,
오히려 로마의 루쿨루스 같이 약탈을 금지한 지휘관들이 항명을 겪거나 아예 군대에서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결국 공성전의 스트레스, 시가지 지휘의 어려움, 약탈을 허용하지 않으면 통제불가능하게 쌓이는 병사들의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부분의 경우 도시가 함락되면 공성군은 지휘관의 방조 내지 독려 속에 도시를 신나게 약탈하면서 군기를 마음껏 상실하고는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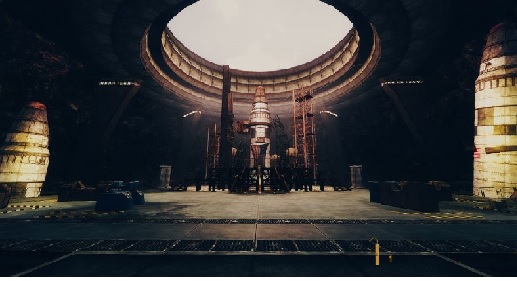





청군이 명나라 상대로 학살 벌인 사건도 공성전 와중에 2천명인가 죽어서 그랬다는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