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가 차바퀴에 깔린 것인지 그대로 납작해진채로 죽어있었다. 옆에는 이미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다. 아마도 내부 장기겠지. 피는 다 공기에 닿아서 응고되고 고무타이어에 점막이 마찰되면서 그대로 까만색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근처엔 평소엔 별로 본 적이 없던 노란색의 파리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파리들은 차가 올 땐 도망가면서도 쉬 다시 와서 쥐의 시체를 탐닉했다. 난 그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고.
적어도 내가 느낀 감정이 혐오는 아니었던 것 같았다. 환희는 더더욱 아니었고. 난 그 이름모를 쥐를 애도하고 있던 걸까. 사람들이 그렇게 구제하려 애쓰는 쥐에게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연민을 품는 것이 옳은 행위였을까.
그 쥐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병에 걸려서 죽고 있는데. 그 쥐가 다 병충해를 옮기고 다녀서 농가에 해를 끼치는데. 그렇게 이로운 점이라곤 없는 쥐가 죽었으면 하나된 인류로서 나는 마땅히 기뻐해야만 하는 것이 도리일텐데. 어쨰서 나는 기뻐하지 못했던 것일까.
나라는 사람은 늘 마음속으로 도덕을 논하지만 나는 도덕이 아닌 사사로운 감정에만 움직이는 사람에 불과하다.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무릇 쥐의 씨를 말려버리고 쥐를 다 죽여버리고 쥐가 죽는 꼴을 볼때마다 응당 기뻐해야 하는데. 그것이 쥐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도리일진데.
쥐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감히 내가 뭐라고 그 쥐를 용서해주고 그 쥐를 애도한단 말인가.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내가 무슨 권한이 있는데.
어쩌면 그 쥐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굳이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동물을 힘들게 할지도 모르는 존재인데. 해를 입혔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나는 그 쥐의 죽음을 기뻐하기는 커녕 오히려 앞에 서서 가만히 있었다니. 이래서야 완전히 쥐를 추도해주는 꼴인데. 나는 쥐를 추도해줄만큼 삶이 넉넉했던지. 아니, 인류가 쥐를 추도해줄만큼 삶이 넉넉했던지.
나는 나 하나 챙기지도 못하면서 사사로운 감성에 도덕성이라는 허울을 들이밀고 자기만족만 했었다. 내가 늘 하는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해악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람직한지는 의문이 드는 행동을 저질렀음애도 후회는 없었다. 그 행위로 인하여 내 마음이 편해졌으니까. 결국 난 그런 사람이었다. 천하의 이기적인 사람. 자기 기분이 편하다면 아무 생각 없이 내 눈에 먼저 띈 한 쪽에 서버릴 사람.
어찌보면 제 분수에 걸맞은 일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최대한 진실로부터 자신을 가릴 수 있는 철판을 씌우고 싶다. 나는 백해무익한 쥐를 애도하여 쓸데없는 짓을 한 사람이라는 진실로부터 날 가리고 싶었다.
그 쥐가 죽은 거리를 나는 다음날도 갔다.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파리의 발걸음은 언제부터인가 끊겼었다. 검은색으로 변색되어있던 무언가는 더더욱 변색되어 아예 갈색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쥐를 멍하니 쳐다보는 행위를 멈출 수 없었다.
쥐는 참 오랫동안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한 2주 정도 되는 기간동안 나는 집에 가는 길을 지나갈때마다 도로의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쥐의 시체를 바라보았다.
보름이 지난 후 쥐의 시체는 사라졌다.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알 길은 없으나 강아지도 고양이도 아닌 쥐를 무덤까지 만들어주면서 묻어줄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 쥐는 쏟아진 커피를 닦은 뒤 말라붙은 휴지하고 부러진 나무젓가락과 함께 화장터로 끌려갔을까. 난 모르겠다.
어색한 부분을 고치고 그떄의 정황을 좀 더 다시 떠올려서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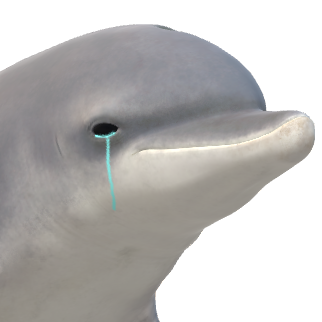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동물의 죽음을 보면 대개는 숙연해지기 마련이지요.
그렇겠죠 보통은. 그런데 그 순간의 나는 너무나도 죄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