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의 눈에 비친 소현세자는 여러 콘텐츠를 통해 조선을 바꿀 수 있었던 인물로 격상된 ‘영웅’이 아니었다. 병자호란이라는 치욕적인 경험을 극복하고 부국강병의 조선을 건국하여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우리 안의 작은 ‘영웅’이 아니었다. 전쟁 패배의 희생양이 되어 26세에 불과했던 1637년부터 8년 동안 인질 신분으로 청의 수도였던 심양에 머물러야 했던 ‘인간’이었다. 힘의 우위를 확인받으려는 청의 의지와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조선의 시도가 사사건건 충돌하던 시공간의 중심에서 그러한 충돌의 직격탄을 매순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던 ‘인간’이었다. 원대한 미래를 꿈꾸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짐에 허덕이다가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병을 얻어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인간’이었다.
저자는 이를 ‘조선이 근대화에 실패한 이유’ 관련 담론에서 찾는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많은 일본인과 조선인 학자들은 조선의 근대화 실패 원인을 찾아 나섰다. 일본인 학자들은 조선이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조선인 학자들은 지난 역사를 반성하고 원대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말이다. 그 과정에서 광해군이나 소현세자 등이 조선을 근대화로 이끌 수 있던 인물들로 호출되었다. 이 담론은 새롭게 발굴된 소현세자 등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쳐 보기도 전에 사라지면서 조선이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결론으로 끝맺는다.
저자는 ‘소현세자’를 ‘근대화의 영웅’으로 치환했던 100년 전 일본인과 조선인 학자들의 욕망이 오늘날 ‘소현세자 서사’의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소현세자라는 인물 자체의 삶이 아니라 소현세자를 통해 구현될 욕망”이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영웅’ 소현세자를 원하는 분위기에서 역사 속 ‘인간’ 소현세자가 설 자리는 없었다. 정작 중요한 소현세자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저자가 책의 제목을 ‘소현세자는 말이 없다’라고 붙인 이유이다.
저자는 말한다. “과거의 인물에게 현재의 열망을 투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하지만 그 열망이 자칫 과도할 경우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는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놓여야만 한다. 현재의 과도한 열망으로 시계추가 기울어졌다면 돌려놓아야 한다.” “21세기의 ‘영웅’ 소현세자가 아니라 17세기 격변기의 ‘인간’ 소현세자에 주목해야” 한다는 저자의 역설이 유의미한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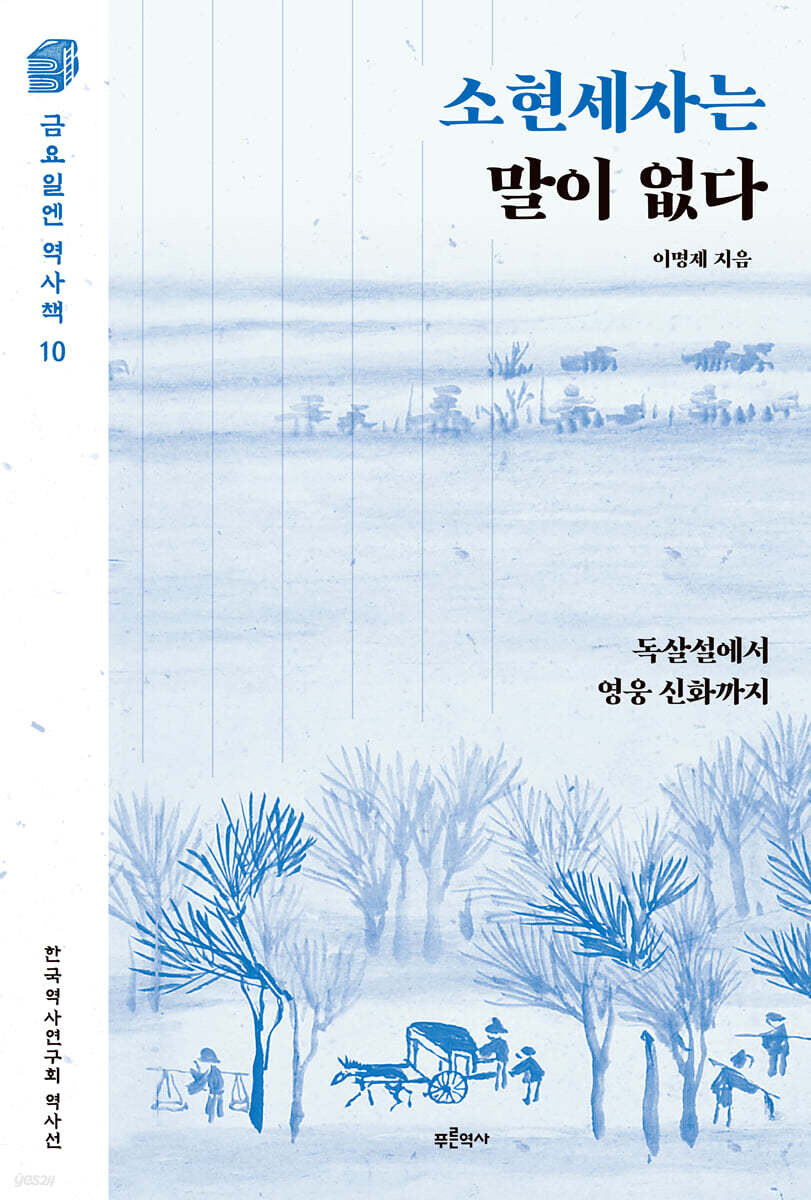
고봉밥ㄷㄷㄷ
그래도 나오는 조선역사의 암살설 중 하나
역사학계든 종교/철학계든 은근 연구자의 주관이 너무 투여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